가지산도립공원 산행 Photo 에세이(2) / 운문산
(2010년 9월 30~31일 무박산행/ 석남터널 -가지산 -운문산 -석골사/고양시우정산악회 따라)
*. 운문산(雲門山) 가는 길



가지산 정상의 이정표가 ‘운문산 5.3km/아랫재 3.8km/석남터널 3.1km' 를 가리키고 있다. 산에서 가장 반가운 것이 이정표다.
운문산을 향하여 막 서남쪽으로 향하려다 보니 가지산 정상 바로 아래 ‘가지산정상대피소’가 있다. 건물은 가건물인데 자세히 보니 태양열 발전 시설이 되어 있다. 작년에 제주도 최남단 마라도에 가서 보던 것보다는 아주 작은 시설이었다.
이를 보고 생각나는 것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앞만 보고 달리는 말 같은 젊은 산악회원들을 따라 다닐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느긋하게 내 몸에 맞는 종주할 수 있는 곳이 가지산도립공원이었구나 하였다. 대피소 앞의 의자들이 지리산 치발목 산장을 생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망팔도 훨씬 지난 작년에 지리산, 설악산은 물론 한겨울에 덕유산 종주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대피소 덕분이었기에 하는 말이다. 
헬기장을 지나 아랫재로 가는 길은 전부가 평탄한 능선 길이었다.
해발 1,000m 이상의 길에 산죽이 양쪽으로 늘어선 오솔길로 그 산죽을 무릎으로 헤쳐 가며 가는 그런 조용한 길이었다. 산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이라더니 초가을 서늘한 바람은 고맙게 속삭이며 전설 속에 할아버지가 죽어서도 딸을 사경에서 살려준 은혜를 갚으려고 오솔길의 풀을 맺던 결초보은(結草報恩)의 고사(故事)를 생각하게 하였다.
굽어보는 먼 산은 산 첩첩하였고, 그 산들 사이의 연무는 천국의 세상을 엿보는 듯 나를 황홀하게 하였다.
길의 좌측인 남쪽은 절벽 구간이었는데 도중도중에 커다란 암봉이 기이한 봉을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보태주고 있었다.
그 능선 끝에 이정표 ‘아랫재 1.3km. 운문산 2.2km/ 백운산 1.7km’ 로 백운산(白雲山, 885m)과 운문산의 갈림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아랫재까지는 40분 거리였다
산에서 가장 반가 아랫재에도 허름하나마 ‘加雲山房’ 이란 아름다운 이름을 지닌 대피소가 있다. 산속에 있는 집이라는 산방(山房)에다 구름[雲]을 더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지나온 두 산장과 달리 문(門)도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 통나무를 기둥으로 하고 천막으로 벽과 지붕을 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앉으라고 사방을 긴 의자로 꾸몄다. 그러나 난로는 부서져 뒹굴고 쓰레기가 지저분한데 낙서가 다른 곳과는 격이 다르다.
‘감사히 머물다 갑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 가족 건강하게’
거기 서있는 이정표를 보니 가지산에서는 3.9km를 온 것이고 운문산 정상은 1.5km이나 남았다. 석남터미널에서 가지산 오르는 거리가 3.0km이었으니 여기서는 지친 몸으로 그 절반 정도를 또 올라야 한다.
그런데 그 ‘加雲山房’이 있는 이 안부가 운문사로 가는 갈림길이다.
‘운문사’ 표지에는 거리가 쓰이지 않아서 그렇게 가까운 주변인가 하고 지도를 보니 3시간 30분 이상 더 하산하여야 하는 거리였다.
*.운문사(雲門寺) 이야기 
호거(虎踞)란 기세가 범이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을 말함이니 여기서는 돌산 가지산(加智山)의 지세(地勢)가 웅장한 모습을 말함이라.
호거산(虎踞山)이라 함은 이 절의 입구에서부터 운문산 주봉으로 이어진 산줄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산세가 이렇게 장엄하고 신라의 서울인 경주가 지척이었으니 불교국가인 신라에서 절을 여기에 어찌 세우지 않았겠는가.
운문산 북쪽 기슭의 이 운문사는 진흥왕 때(591)에 신승(神僧)이 창건된 절로 이 절의 경내의 당우(堂宇)로는 우리나라에서 사찰 건물 중에 가장 크다는 만세루(萬歲樓)라는 이조초기의 건물이 있고, 그 앞마당에 앞서 말한 작갑전(鵲岬殿)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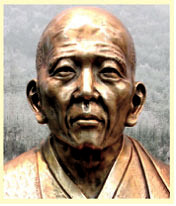
운문산을 암산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암산(巖山)이 아니라 암산[女山]이다.
그래서인가. 이 일대 절에는 비구니 사찰이 많다. 그 중 운문사에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비구니의 ‘운문승가학원’이 있다. 1987년에는 승가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 약260여 명의 비구니가 승도의 길을 걷고 있다.
운문산 오름길이 오늘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가지산 오를 때보다는 덜 힘들었지만, 조금 전 내려온 가지산 능선이 1,000m인데 그보다 더 높이 올라야 하는가 하니 다시 또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올라가면서 뒤돌아보며 능선과 운문산 길의 높이를 비교할 때는 걱정이 되더니, 저 능선을 눈아래 두이 회심의 미소가 입가에 맴돈다. 고진감래(苦盡甘來)의 기쁨이었다.
산에 힘들여 오르다 정상이 가까워지면 정상 같은 곳이 정상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다.
운문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얀 거친 바위를 보고 있어야 할 정상석을 찾아보아도 없다. ‘전망 바위’였다. 

운문산 정상은 또 하나의 봉을 이루어 두고 막 피어난 억새풀 우거진 사이로 놓인 통나무 길이 끝난 곳에, 천국의 계단 같은 나무 층계가 정상을 향하여 오르고 있다.
앞의 가지산 능선이 점점 낮아지더니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나 ilman도 오늘 가지산 정상에 내 키를 더하였다.
하늘과 땅 사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너르고 굳고 맑고 올바른 기운을 호연지기(浩然之氣)라 하지 않던가. 갑자기 살아있다는 보람에 시흥(詩興)에 겨워 감격의 노래를 불러 보고 싶다.

친구야!
어디서
어느 산에
몸이 마음을 부리는 나이 뿌리치고
천리 길을 건강한 산악회 따라 왔기에
온 하루가 우리 마누라의 남편뿐이었다네.
오름길의 거친 숨은 진한 땀이 되고
능선 길은 노래가 되고,
산과 세상은 굽어보는 풍류가 되어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오늘이었다고 대답하고 싶다네,
그곳이 오늘은
가(加)
지(智)
산(山)
도립공원이었다고.
*. 하산 길 억산(億山, 944m) 이야기
가지산이 산림청이 정한 한국 100산 중의 하나인 명산(名山)이라면, 억산(億山)이란 산이 많다는 뜻일 게다. 수많은 많은 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산이기에 생긴 말이라는 말이다.


이 계곡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험한 너덜겅 길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국내외로 등산을 다녀보았지만 이와 같은 돌길은 처음이다. 돌의 나라요, 돌의 세상이었다. 그 돌도 쓸모없는 막돌인데 나의 무릎은 쾅쾅 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속도는 전처럼 느려야 했다.
상운계곡 하산길 우측은 층암절벽의 바위산이었고 가는 길엔 돌탑이 많았다. 지도에서 보니 큰 바위로는 전구지바위, 치마바위, 용바위 . 범바위 등도 있었지만 표시가 없어서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이름이 있는 유일의 전구지바위가 있었는데 그것도 바위에 돌로 두드려 쓴 글자여서 어느 호사가(好事家)가 자기 이름을 쓴 듯해서 그 바위 이름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았다.
폭포로 상운암 근처에 선녀폭포, 석골사 근처에 석골폭포가 있었지만 미국의 나이야가라 등을 보고 다닌 나의 눈에는 폭포 같지 않은 폭포였다.
길은 위험한 돌뿐이고 무릎보호대를 하고 겨우 겨우 내려가야 하는 지루한 길이라서 스스로 재미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사진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엮어 보았다.


조릿대가 묻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내가 예쁘니, 내 그림자가 예쁘니?"
작대기도 묻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이렇게 큰 바위를 받치고 있으니 내 힘 세지?"


돌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묻습니다. "내 신과 ilman 선생의 신 중 어느 것이 크지요? "
나무가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석골사(石骨寺)도 그랬다. 돌이 얼마나 많으면 절 이름도 석골사石骨寺)라 했겠는가. 거기 가면 멋진 돌로 만든 작품이 있겠거니 하고 별렀더니 막상 가서 보니 했더니 이름만 석골사라 한 평범한 산사(山寺)일뿐이었다.
석골사 가지 전에 억산(億山) 길과 합류되는 길 이정표가 있었으니 억산에 얽힌 돌에 관한 전설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 옛날 억산아래 대비사란 절집에 주지스님과 상좌가 함께 기거하며 수도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상좌의 몸이 너무나 싸늘한 것이었고, 스님이 잠든 깊은 밤이면 몰래 일어나 어디를 다녀오는 것이었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스님은 어느 날 밤 상좌의 뒤를 밟기 시작했는데 억산 아래 있는 대비못에 이르자 상좌는 옷을 훌훌 벗더니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못의 물이 쫙 갈라지더니 상좌가 이무기로 변해서 못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더니 다시 옷을 입고 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산 능선을 넘어 운문사 쪽으로 급경사진 곳(속칭 이무기못)에 이르자 상좌는 또다시 웃옷을 벗더니 커다란 빗자루로 돌을 쓸어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신기하게도 상좌의 비질에 크고 작은 돌들이 가랑잎처럼 쓸려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스님은 너무나 놀래서 자기도 모르게 "상좌야 거기서 무얼 하느냐"고 외치듯 묻고 말았답니다. 이에 놀란 상좌가 스님을 발견하고는 탄식하였답니다.
"1년만 있으면 천년을 채워 용이 될 수 있는데 저 중 때문에 1,000년을 못 채우는구나, 아, 억울하다."
크게 탄식하더니 갑자기 이무기로 변해 밀양 방면으로 도망가면서 꼬리부분으로 억산 산봉우리를 내리치니 산봉우리가 두 갈래로 갈라졌답니다.
정상에 가보면 정상부의 거대한 바위가 둘로 쪼개져 있는 것은 그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런가. 석골사가 가까워지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너덜겅 길은 사라지고 잔돌로 된 평탄한 하산길이 계속된다.
여기서부터는 손전화 통화 가능 지역인가. 손전화가 울려온다.
뒤풀이를 하고도 오지 않는 나를 기다리는 소리다. 함께 와서도 함께 할 수 없이 낙오되어 떠도는 나의 슬픔은 가지산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진작에 대피소가 있다는것을 알으셨다면 천천히 모두 잘 살펴보실것을
아쉽게 되었지만 덕분에 가지산과 운문산까지 잘 배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